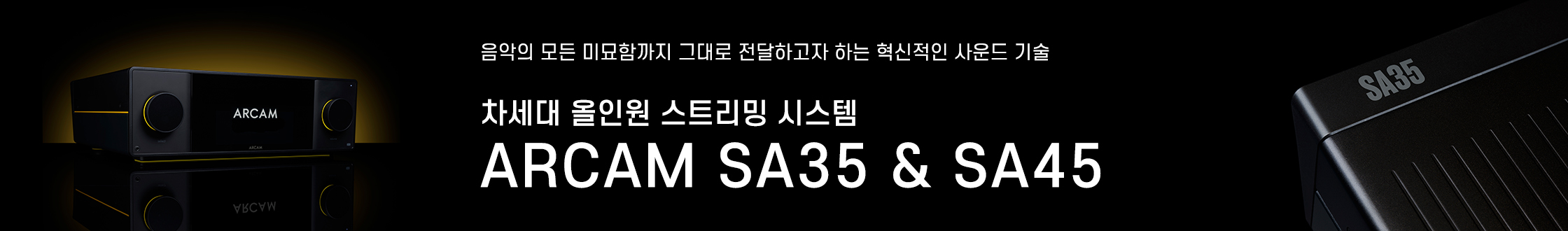리뷰어로 활동한지도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동호인으로 그저 음악 좋아하다가 길을 바꿔 리뷰어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나의 취향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흥미롭다. 내가 나를 관찰한다니 어불성설 같지만 때론 자기 객관화도 필요한 법. 음악도 팝, 록, 재즈에서 여전히 재즈를 좋아하긴 하지만 클래시컬 음악 비중도 예전에 비해 좀 더 높아졌다.
틸, 토템, 포칼, 윌슨 같은 스피커를 좋아했다. 과거 핀 포인트 포커싱에 입체적인 무대를 그리는 스피커들, 대개 미국 쪽 사운드를 좋아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온기가 있고 매끄러우며 특유의 음촉이 개성있게 빛나는 소리를 추구하게 된다. 너무 저음압에 타이트한 소리보단 약간은 풀어져도 자연스러운 물리적 움직임을 보이는 소리가 좋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 선택한 게 최근 락포트 Atria다.

락로트 Atria는 여러 하이엔드 스피커들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스피커지만 결이 조금 다르다. 인클로저의 공진을 최대한 억제해 드라이브 유닛 자체의 소리에 훼손이 가지 않게 만들었다. 위상 일치에 대한 부분도 설계에서 엿보이며 트위터는 특주 베릴륨 유닛이다. 포칼이나 여타 스피커들의 베릴륨 중 매지코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소리를 내준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들과 달리 촉촉한 촉감이 흐른다. 부드럽게 고역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그냥 쾌감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음악적 코히어런스가 충만하다. 아마도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꽤 오래 나의 리스닝 룸에 머물 것 같다.
그러나 하나만으로 취향을 만족할 순 없는 법이다. 이런 여분의 욕구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인 스피커에 모든 취향을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항상 서브 시스템을 꾸려서 취향의 잉여분을 만족시키곤 한다. 최근 듣고 싶었던 것은 약간의 기분 좋은 착색과 통 울림이 조금 동반된 따뜻한 소리다. 그렇다고 해상력이 결여된 스피커는 용납이 안 된다. 보다 고전적인 아우라를 간직하되 최신 스피커에 비해 그들만의 지향점이 분명한 개성 있는 소리.

이런 소리에 대한 갈증은 여러 스피커를 물망에 올리게 되었는데 우연히 리뷰를 진행하다가 마주친 스피커가 이러한 갈증을 씻어주었다. 다름 아닌 리바이벌 오디오의 Atalante 시리즈다. 그 중 Atalante 5가 당연히 가장 좋지만 공간의 한계로 Atalante 3를 구입했다. 다인오디오와 포칼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엔지니어 다이엘 이몽이 촉발시킨 프랑스의 신생 브랜드. 어쩌면 넥스트 다인이나 포칼로 성장할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든다.
아무튼 이 스피커를 들인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매일 매일 몸을 풀며 소리 변화를 살펴보는 게 요즘 커다란 낙이다. 오디오 쇼 때문에 거의 못 듣다가 케이블링을 병행하면서 스피커 번인 과정을 밟았다. 음원은 케이블 메이커 XLO에서 예전에 발매했던 음원. 여러 유익한 음원들이 많지만 번인을 위해 9번을 집중적으로 재생해 몸을 풀어주었다. 물론 이거 너무 큰 음량으로 종일 무한 반복하면 스피커 고장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

첫 눈에 반했던 스피커라 일단 기본적인 특성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개성이 뚜렷해 곱씹어 듣는 재미가 있다. 마치 에소타를 연상시키는 소프트 돔 트위터는 고역이 하이엔드 스피커처럼 탁 트여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하다. 한편 7인치 미드/베이스는 이전에 번인이 되어가면서 탄력이 붙는다. 이전에 유튜브 촬영할 때보다 저역의 스케일도 한껏 더 높아져 사실 작은 방에서 사용한다면 서브가 아니라 메인 스피커로 Atalante 3 한 조만 사용해도 충분할 듯하다.
점점 소리가 무르익어가는 중인데 처음에 약간 깔깔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초반엔 강력한 비트의 팝이나 록, 대편성 위주로 듣다가 오늘은 피아노, 기타 등 독주나 소편성 위주로 듣고 있다. 역시 갈수록 피아노 소리에 부드러운 고해상도 뿐만 아니라 달콤한 기운이 더해진다. 음질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에…아무튼 간만에 매력적인 스피커를 만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과연 10년 전에 나는 이런 소리를 좋아했을까? 취향의 재발견이다.